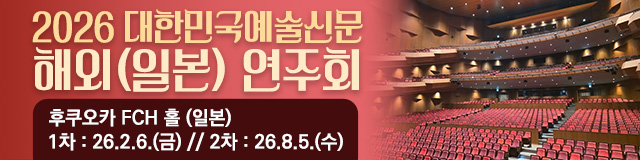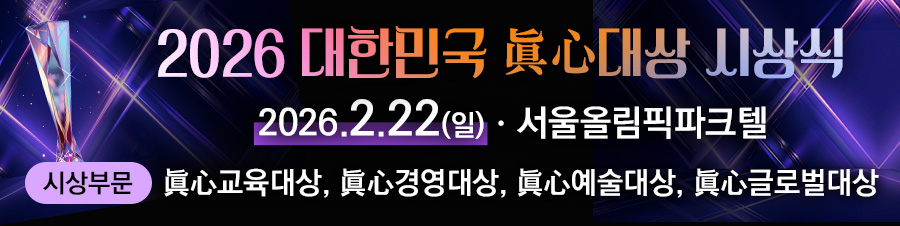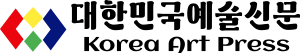차이콥스키 – 진정성과 존중의 조화로운 선율
뜨거운 여름, 이글거리는 더위가 마음의 바람길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 넣는듯하다. 흐르는 땀에 얼굴이 찌푸려지고 지쳐 보이는 여성과 마주한 오후. 무엇이 날씨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걸까? 얼음을 살짝 띄운 수박 주스를 앞에 두고 숨을 고르는 동안 마음의 온도도 내려간 듯 이야기는 시작된다.
아이를 키우며 뒤늦게 다시 일을 시작한 그녀는 어느 고마운 분의 도움으로 일이 자리 잡아가고 있을 무렵,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준비한 선물을 가방에 넣어두고는 만날 때마다 잊고 전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어 차일피일 미루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섭섭함을 표하는 것이었다.
당황한 그녀는 제때 감사함을 전하지 못해 혹여 그분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되어, 섭섭한 마음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는 공감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몰두하다 보니 없는 말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죄송함을 전하는 걸로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왜 감사의 표현이 서투냐?’는 질문에 정신없어 잊어버린 것 말고는 딱히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 급히 적절한 답을 찾다 보니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보답이 부족했나 보다.’라는 등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오히려 ‘후하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다니….’라는 말을 평소에 듣고 살아온 자신을 깨닫고, 그분의 기분을 맞추기 급급해 자신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다.
고마움을 표현할 거라 기대한 그에게 마음을 전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려 난감했던 그녀와 함께 들은 곡은 차이콥스키 Tchaikovsky <피아노 협주곡 1번> Piano Concerto No. 1 in B♭ minor, Op. 23이다. 이 곡은 원래 러시아 최고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연주해주길 바라고 작곡했다. 루빈스타인은 차이콥스키가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재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던 분이라 두 사람은 관계가 좋았었다.
1874년 크리스마스이브, 차이콥스키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각하고 악보를 챙겨 루빈스타인에게 피아노 초연을 부탁하러 갔다. 그러나 스승이기도 했던 루빈스타인은 자신에게 자문하지 않고 피아노곡을 완성해버린 차이콥스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마음이 상한 루빈스타인은 곡의 단점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혹평했다. 그리고서 몇몇 부분을 수정하면 연주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미 화가 난 차이콥스키는 거절했다.
그는 당시 유럽 최고 지휘자이며 피아니스트였던 한스 폰 뷜로에게 곡의 초연을 의뢰했고, 악보를 검토한 뷜로는 곡의 독창성과 강렬함을 칭찬하며 1875년 10월 25일 보스턴 심포니와 초연했다. 뷜로는 이 곡을 그 시즌에만 무려 130회 이상 연주할 정도로 그날의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이후 차이콥스키는 미국에서 큰 명성을 얻고 미국 음악계의 스타가 되었다.
3년 후 루빈스타인은 그에게 자신이 지나쳤다고 사과했고 둘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다. 차이콥스키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빠르기와 아티큘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등 여러 번의 수정 끝에 15년이 지난 1889년, 지금 우리가 듣는 화려한 걸작으로 이 곡을 완성했다.
강렬한 화음과 넓게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이 연상되는 1악장, 서정과 해학이 돋보이며 피아노와 목관 악기의 조화가 아름다운 2악장, 역동적이고 힘찬 피날레 3악장을 함께 들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스승인 자신에게 음악적 조언을 구하지 않아 섭섭함을 느낀 루빈스타인, 고마운 마음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 차이콥스키, 두 사람 그 누구도 잘못된 사람은 없는데 서로 간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해 소원해진 그들을 생각하니 지금 본인의 입장과 비슷하단 생각이 들어 2악장의 선율이 그녀의 마음으로 더욱 깊이 흐른다. 또한 강한 어조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듯한 1악장의 당당함이 부럽다고 한다.
선율, 리듬, 셈여림의 조화가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하듯 자기 존중감, 공감, 긍정적 상호작용이 어우러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차이콥스키가 몇 년간 고민하고 고쳐가며 곡을 완성해나가듯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는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섭섭함을 표현했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이야기는 이어진다.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그녀와 ‘일기 쓰기’나 ‘감정 카드 활동’ 등을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로 약속했다.
누군가와 공감하고 격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관계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표현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하자.
타인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하여 타인의 기대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하는 훈련을 해보기로 했다.
‘나’의 실수를 인지하고, 그 실수로 상대에게 미친 영향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과 나를 해치지 말아야 하는 균형의 중요함을 느낀 그녀는 오늘도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들으며 적절한 표현에 관한 고민과 연습을 하고 있다.
‘너는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네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최영민 작가
[학력]
경북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석사
대구한의대 치유과학과 박사(ABD)
[경력]
전 대구과학대학출강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심리위원
아카데미 예송 대표
'마음이 머무는 클래식' 진행
[시상]
2024 대한민국 眞心예술대상 수상
[저서]
'마음이 머무는 클래식' (에듀래더 글로벌 출판사, 2025)
[대한민국예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