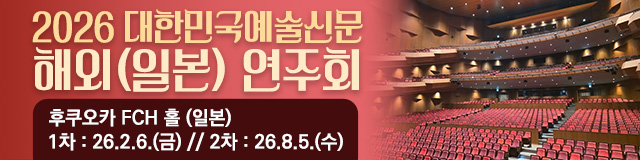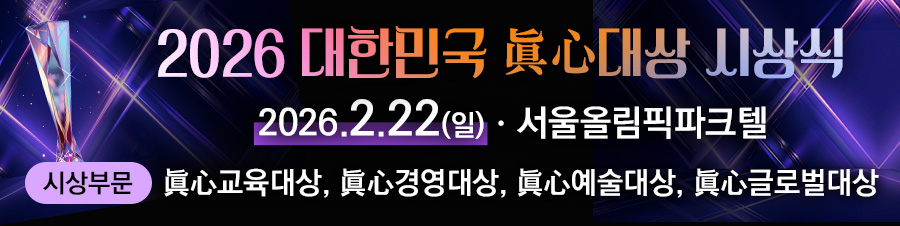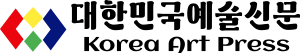베토벤 – 상실 속에서 배운 깨달음
계절의 온도에 따라 마음의 색채는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단풍잎의 존재는 길을 걷는 이로 하여금 변화하는 계절을 선물하기에 충분하다. 가을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사색의 여유를 안겨준다.
최근 며칠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초대되어서인지, 삶의 의미에 관한 생각이 많아진다. 수업 전 특히 우울해 보이던 한 분이 수업 후 변화된 모습을 보며, 과연 삶이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이가 들었다는 왠지 모를 상실감으로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고 느끼며 존재의 무력감을 느낀다는 그분은 ‘오늘도 친구가 가자 하니 왔지.’라며 수업 참여 동기를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수업해요.’
넌지시 남기신 그 말에는 ‘남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데 쉽지 않네.’라는 간절함이 어려있었다.
노화를 신체적 관점에서 보면 성장이 끝나고 쇠퇴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관점에서 노화를 바라본다면 오늘도 성숙한 변화로 조금씩 나아가는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일기를 함께 써 보며 음악을 듣는다. 그 곡은 바로 베토벤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2번(Romance for Violin and Orchestra No. 2 in F major op. 50)>이다.
로망스는 15세기 스페인의 예술가곡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세기 말 기악 로망스가 유행하고, 특히 서정적 선율과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와 작곡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로망스 2번은 베토벤의 작품 중 바이올린 레퍼토리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곡은 1798년 작곡되어 1805년에 출판되었다. 이때 베토벤은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청력상실을 선고받았고, 더 이상 음악 활동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을 마주하게 된다. 의사의 권유로 그는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 갔다가 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유서에는 다가온 시련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있지만,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운명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그 다짐으로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에 침잠하게 되고 걸작의 숲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곡은 베토벤 내면의 깊은 감정과 자유로운 영혼의 갈망이 표현되었고, 낭만주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악 로망스 장르를 개척한 곡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시작부터 바이올린이 노래하듯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이어 오케스트라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관현악단의 웅장함과 심연을 파고드는 고뇌가 느껴지는 바이올린의 애절함은 삶의 희망을 간절히 바라는 베토벤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감동이 더해온다.
함께 곡을 들으며 감사일기를 써 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삶이 시작된 순간을 기점으로 오늘을 본다면 가장 늙은 날일 수 있지만, 아직 남은 날을 기준으로 삶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일 수 있음을...
프랭크 브루니의 책 <상실의 기쁨>을 보면 상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무언가를 얻을 기회라고 한다. ‘상실은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우리를 더 치밀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시력을 잃은 후 저자는 눈으로 보는 대신 마음의 눈으로, 결과를 좇는 대신 과정을 느끼며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를 추구했다. 불편함 속에서 삶이 주는 지혜를 놓치지 않은 저자처럼 노화에 대한 상실보다는 성숙을 통한 삶의 통찰로 겸허히 오늘을 받아들이게 된 그분은 수업을 마친 후 내게 다가오셨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내 관점에서 사라져가는 것들만 보았네요.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가을의 기척 속에서 실존적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존재의 깊이를 묵상한다. 낮과 밤 사이의 경계인 ‘dusk(황혼)’는 빛과 그림자의 공존을 상징하듯. 상실은 부정해야 할 어둠이 아니라 남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하는 기회로 해석하려는 저자의 이야기와 함께, 베토벤의 고난을 환희로 승화한 삶의 의지를 배운다.
능력의 소멸이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진 않는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으로 바라보려는 태도의 변화는 삶을 향한 희망의 문이 될 것이다.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세상은 나에게 시야를 주었다.’
- 프랭크 브루니 -

최영민 작가
[학력]
경북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석사
대구한의대 치유과학과 박사(ABD)
[경력]
전 대구과학대학출강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심리위원
아카데미 예송 대표
'마음이 머무는 클래식' 진행
[시상]
2024 대한민국 眞心예술대상 수상
[저서]
'마음이 머무는 클래식' (에듀래더 글로벌 출판사, 2025)
[대한민국예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