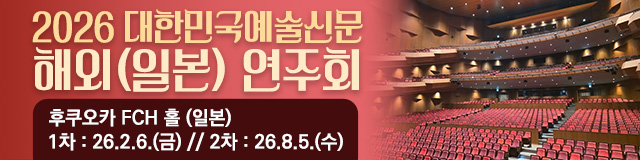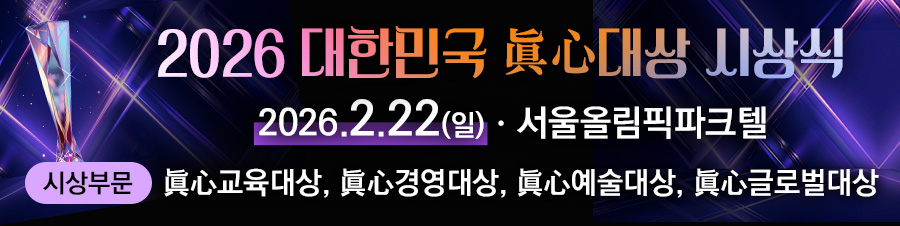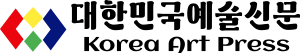베토벤 – 함머클라비어와 그녀의 모놀로그
뜨거운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눈이 부신 오후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고운 결이 느껴지는 그녀와 마주한다. 세련된 말투, 입꼬리를 올리며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를 건넨 그녀는 커피 한 모금과 함께 깊은숨을 삼킨다.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며, 라벤더 향기가 풍기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잠시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녀는 대학 진학을 뒤로하고 취직하여 여동생, 남동생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다행히 성실한 동생들이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자리 잡은 후, 그동안 미루어 온 자신의 공부를 계속하며 여러 직업을 거쳐 결혼한 남동생의 아들까지 유학 뒷바라지를 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녀는 고마움을 알아주는 동생들 덕분에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던 중 사춘기에 접어든 조카와 마찰이 생겼다. 학원을 경영한 경험이 있던 그녀는 조카의 교육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조카는 그런 고모가 부담스러웠는지…. 점점 멀리하는듯한 느낌은 급기야 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잘 견디며 살아온 스스로에 대해 충만함이 가득했던 그녀는 조카와의 불화로 동생과도 멀어지는 듯하다며 어려움을 애써 전한다. 그녀와 함께 우리가 들어본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 Piano Sonata in B flat major, op. 106 “Hammerklavier”이다.
이 곡은 베토벤이 1817년 11월경에 시작해서 이듬해 초 두 악장이 먼저 작곡되었고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여름, 조카 카를과 휴가를 떠났을 때 다시 작곡하여 가을쯤 완성된 훌륭한 작품이다. 4개 악장으로 연주 시간이 40~50분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작품으로 베토벤의 음악적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피아노곡의 창작 양식이 어떤 형식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곡이다.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형이상학적 세계를 구현하려 한 베토벤의 예술적 경지를 느낄 수 있다.
부제인 ‘함머클라비어’는 그 시절 기술적으로 개량된 피아노를 뜻하는 ‘피아노포르테’를 독일어로 표기한 것으로 망치(Hammer)와 건반악기(Klavier)의 혼합명사이다. 하프시코드가 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것과는 달리, 피아노포르테는 햄머가 현을 때려서 소리를 내게 되어 음량이 크고, 페달의 발달 등 셈여림을 비롯한 다양한 뉘앙스의 표현이 가능했다.
이 곡을 작곡할 즈음 베토벤의 심경은 상당히 힘들었다. 그의 첫째 동생 카스파가 결핵으로 4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조카 카를의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고, 소송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겨우 열 살이었던 카를은 계속해서 법정에 불려 다녀야 했고, 삼촌이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결국 베토벤은 카를의 양육권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조카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조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주려 했으나, 조카 카를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칭찬했다가 혼을 내는 삼촌이 힘들었다. 베토벤의 입장에선 최선을 위해 봉사하고 봉사해야만 했던 것이었는데….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3악장은 아다지오 소스테누토(Adagio sostenuto), 아파시오나토 데 콘 몰토 센티멘토로 연주하여 ‘느리게 한음 한음 깊이 눌러서, 열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아주 느린 호흡으로 명상적 선율이 나지막이 흐른다. 이 악장의 지시어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그녀가 묵묵히 견뎌낸 시간을 보듬어주는 듯하다.
먹먹한 슬픔이 켜켜이 쌓여 깊은 내면의 고통과 마주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듯 쉼표와 음표로 묻고 답한다.
3악장의 엄숙하고 장중한 선율을 들으며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자기 경험을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격정적이고 긴장된 부분은 그녀가 억누른 분노와 부담을 안전하게 분출하게 하고,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선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베토벤의 음악은 단순한 감정 해소라는 단계를 넘어, 그녀가 자문(自問)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얼마나 오래 나의 행복을 미뤄왔는가?”
책임과 의무가 지나쳐 ‘나’를 잃는 순간 진정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음악 속에서 삶을 돌아보며, 이제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경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랑과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다.
“네가 버텨온 삶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제는 너를 위한 결정을 내려도 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쉰다.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온 그녀에게, 음악이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용기와 치유의 통로이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의 고통과 결의는 그녀가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자유와 경계, 그리고 자기 연민과 이해를 가르쳐주는듯하다.
그녀의 마음속 억눌린 부담이 조금씩 풀리며 삶의 균형을 되찾는 순간을 함께한 3악장을 빌헬름 캠프는 ‘베토벤이 작곡한 가장 장대한 모놀로그’라고 칭송했고, 안드라스 쉬프는 ‘서양 음악사의 정점’이라고 표현한다. 가족을 위한 삶에서 그녀를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명상과 탐구는 내적 긴장과 극적 대비를 구현하는 베토벤의 음악 위에서 가능했다.
"진정한 예술은 인간의 고통을 품는다."
- 베토벤-

최영민 작가
[학력]
경북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석사
대구한의대 치유과학과 박사(ABD)
[경력]
전 대구과학대학출강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심리위원
아카데미 예송 대표
'마음이 머무는 클래식' 진행
[시상]
2024 대한민국 眞心예술대상 수상
[저서]
'마음이 머무는 클래식' (에듀래더 글로벌 출판사, 2025)
[대한민국예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