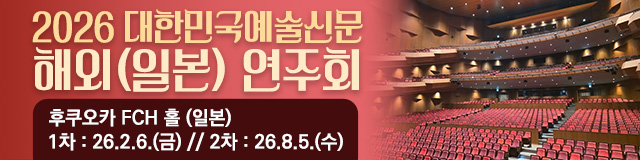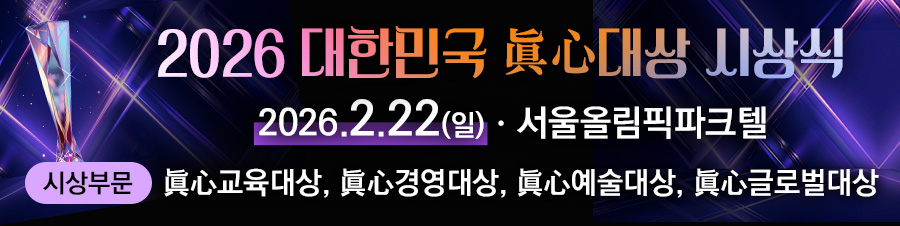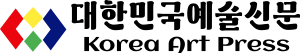존 케이지 – 침묵은 또 다른 시작
계절과 계절 사이에는 환절기가 있고,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숨 고르기가 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사유 또한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확고한 의지로 본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60대 가장, 충분히 예전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단지 그의 생각일 뿐, 회사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퇴직 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설레임은 생각일 뿐, 현실로 다가온 달라진 일상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기력함과 공허가 자리했다.
아직 대학생인 아이의 뒷바라지며 노모의 생활비 등 걱정할 것이 많다는 그와 함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내가 건넨 곡은 현대 음악 작곡가 존 케이지(John Cage)의 <4분 33초>이다. 무대에 등장한 연주자는 피아노를 앞에 두고 4분 33초 동안 어떤 건반도 두드리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악보에는 '침묵'을 뜻하는 음악 용어 'TACET(연주하지 말고 쉬어라)'이 적혀 있다. 악장도 나뉘어 있어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시간을 무작위로 결정하여 4분 33초에 연주가 끝났다. 초판에는 1악장이 33초, 2악장이 2분 40초, 3악장이 1분 20초로 명시되어 있지만 후에는 사라졌다.
제목은 1952년 8월 29일, 뉴욕 우드스톡에서 David Tudor의 연주로 초연에 걸린 시간이며 작곡가는 연주 시간을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다고 악보에 적어 놓았다. 악기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피아노 뚜껑을 여닫는 소리, 관객들의 기침 소리, 냉난방기 소리가 들린다. 작곡가는 주어진 시간 속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된다고 여겼던 것일까?
1948년 존 케이지는 어느 강연에서 ‘침묵의 기도(Silent Prayer)’라는 곡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곡은 완벽한 침묵을 음악으로 구현한다는 생각이 중요했기에 녹음을 위하여 이상적인 공간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1951년 소음 차단이 완벽하게 설계되었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녹음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어떤 소음이 들려와 그는 엔지니어에게 질문하자 “높은 소리는 당신의 신경 체계가 작동하는 소리이고, 낮은 소리는 당신의 피가 순환하고 있는 소리이다”라는 답을 듣게 된다.
이 말에 존 케이지는 ‘죽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정적인 공간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소리는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음악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정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바로 <4분 33초>라는 곡을 만들게 했습니다.’
- 케이지
퇴직 후, 익숙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놓였던 그와 함께 들어본 <4분 33초>, ‘이것도 음악인가?’ 하는 질문에 그는 스스로 답을 한다. 소리 없는 연주 시간 동안 청중들은 각자 자기만의 생각, 삐걱대는 의자 소리, 옆에 앉은 사람과 의아한 표정으로 시선을 주고받는 숨소리가 느껴지네요. 무대 위의 정적인 모습이 단절이 아닌 연주의 또 다른 표현임을…. 그에게 소리의 부재는 소리의 경계를 확장 시키듯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으로 다가온다.
‘위대한 음악은 항상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으며 그 안에 움직임을 품고 있다.
그 속에서 무언가 감동적이고 감정적인 것, 무언가 우울하거나 경쾌한 것이 생겨난다.
말하자면 음악은 어떤 내용,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휴식, 휴지부는 영혼의 숨 고르기와 같다’
- 음악비평가 요아힘 카이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변화의 시간 또한 이 음악처럼 그러하지 않을까요?’
삶의 악장이 바뀌고 리듬 또한 바뀐 그는 낯선 고요 속에서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계획과 성취가 최선이었고, 해야 할 일만 생각했는데... 상황은 변했지만 내 삶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그는 가장의 무게에 묻혀 잊어버린 자신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
퇴직 이후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말하게 된 그와 마주한다. 그동안 일상의 여러 소리 가운데 놓쳐버린 진정한 자신으로 회복하는 공간의 소리를 즐기고 싶다는 바램을 나에게 들려준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연주회 2부가 시작되기 전 침묵처럼, 새로운 울림을 기다리며 기대에 찬 그의 표정을 본다.
아무 음도 연주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깊게 느낀다. 소음이 아닌 내 안의 음악을 듣게 된 그는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연주의 서곡임을... 삶의 멈춤과 변화의 사이를 지나 새로운 악장을 준비하는 그의 시도에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자기 존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마르틴 하이데거-

최영민 작가
[학력]
경북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석사
대구한의대 치유과학과 박사(ABD)
[경력]
전 대구과학대학출강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심리위원
아카데미 예송 대표
'마음이 머무는 클래식' 진행
[시상]
2024 대한민국 眞心예술대상 수상
[저서]
'마음이 머무는 클래식' (에듀래더 글로벌 출판사, 2025)
[대한민국예술신문]